박종기의 '고려의 부곡인, 경계인으로 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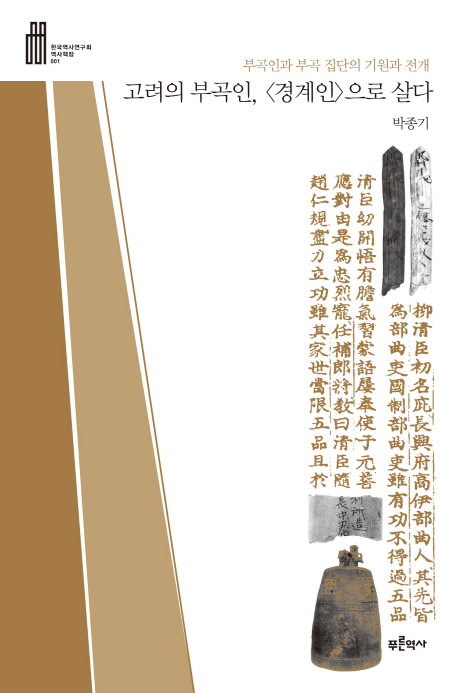
박종기, <<고려의 부곡인, <경계인>으로 살다>>, 푸른역사, 2012.
우리는 하나의 대상을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어느쪽에 분류하려고 한다.
여기 아니면 저기에 속해야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
사상, 종교, 문화, 정치 등등 자기가 속한 혹은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길 강요받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강요한다.
역사학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고려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기 아니면 저기라고 말해야 한다고 무언의 압력을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고려사람들을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하고 부곡에 속하는 사람들(향, 부곡, 소, 처, 장 등)을 어느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저자는 고려시대 부곡집단은 사회경제적으로 왕조정부의 수취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존재로, 생산기능과 역할에 따라 3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향과 부곡, 소, 장과 처의 구분이 그것이다.
향과 부곡은 새로 개간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촌 혹은 고려를 건국할때 반왕조 집단을 지방에 편제하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촌락이다.
소는 광산물, 농수산물, 수공업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곳으로 해당 물품의 원재료가 풍부하게 생산되는 곳으로 주로 설치되었다.
처와 장은 왕실과 사원의 수조지(그 땅에서 사는 세금을 직접 왕실과 사원에 바치는곳)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부곡집단을 양인 혹은 천인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보고자 했다.
하지만 저자는 넓은 의미에서 부곡집단을 양인으로 보되, 양인과 천인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 경계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다.
최근에 박사논문을 준비하면서 안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경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여기에 속하는 것도 같고 저기에 속하는 것도 같은 것이 우리 역사에는 너무 많다.
이것을 내 판단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
아니 직접적으로 말해 너무 어렵다.
또한 문헌이나 자료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줄수 있는 근거가 많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별로 없다.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경계에 있는 것들에 대해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다.
작위적이더라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는 것이 논문을 쓰는데는 효과적이겠지만 그것이 그 당시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역사연구란 당시로 돌아가 그 사회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복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 자르듯이 잘라지지 않는다.
수많은 경계의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되도록이면 끝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역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 카스타레드 "사치와 문명" (0) | 2013.05.29 |
|---|---|
| 강희정 '나라의 정화, 조선의 표상 일제강점기 석굴암론' (0) | 2013.05.07 |
| 박남수의 '신라수공업사' (0) | 2013.02.07 |
|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편, '한국생활사박물관 1~12' (0) | 2013.02.06 |
| 주경철의 '대항해시대' (0) | 2013.01.10 |
